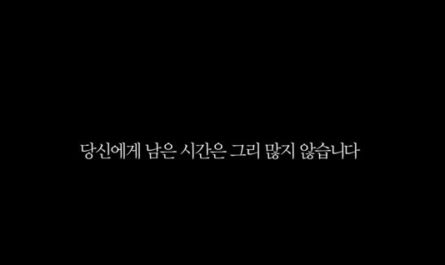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던 딸아이가 뜬금없이 물었다.
“아빠, 기적이 뭐야? 저 삼촌들이 기적을 노래했다는데.”
나는
“아주 신기한 일.”
이라고 간단히 말해 주었다.
“그럼 내 동생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면 그것도 기적이겠네.”
“그렇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첫째를 낳아 본 터라 큰 감흥은 없었다.
12월 초, 아내는 처가로 내려가 출산을 준비했다.
만삭으로 아파트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렸지만,
출산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다.
1일 자정 무렵 병원을 찾은 아내는
밤을 꼬박 새우며 진통에 시달렸다.
꽉 깨문 어금니 사이로 빠져나온
신음만 가득했던 몇 시간,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다.
나는 막 아내 배 속에서 이제 막 나온 아기를 안았다.
탄생의 환희보다 고통에서 해방된 아내에게 더 눈길이 갔다.
아기는 짧고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냈다.
첫째를 낳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간호사가 아기 몸을 닦는다며 양팔을 잡으라고 했다.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순간,
아기가 내 엄지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엄지가 아릴 정도로 세찼다.
갓 태어난 생명에게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났을까.
아기는 그렇듯 죽을힘을 다해 나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기적은 복권 당첨과 같은 우연에 기대는 게 아니었다.
있는 힘을 다해 태어나 숨 쉬고, 말하고, 걷는 모든 날이 기적이었다.
일하는데 아내가 전화해 기저귀를 사 오라고 했다.
옆에서 딸아이가 되물었다.
“엄마, 기적도 살 수 있어?”
퇴근하면 꼭 안고 속삭여 줘야겠다.
‘기적은 바로 너라고,
더는 바라지 않는다고,
그리고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